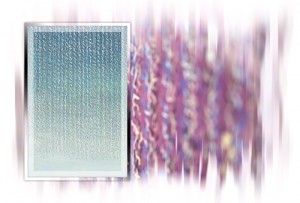강 선 학(미술평론가)
말을 담는 것은 그림만이 아니다. 자연현상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기호로 읽어내려는 노력 역시 말을 담아보려는 일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그런 기호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당연한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각성이야말로 말을 담으려는 진정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윤미옥의 단색조의 작업은 화면 상단부에서 짙은 색으로 시작해서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접점 옅어지다 흰색에 가까운 바탕색을 내보인다. 그런 색조의 배치를 제외하면 별다른 볼 것이 없다. 막연한 연상마저 철저하게 배제해 버린 상태이다. 그러나 얼핏, 혹은 자세히 보면 그 바탕 위에 글씨, 마치 초서를 쓴 듯한 글씨체를 목격하게 된다. 그나마 그 뿐이다. 날려 쓴 글씨라 글인 줄은 알아차리지만 막상 무슨 글인지는 해독이 쉽지 않다. 작가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글인 걸 알아볼 수 있지만 화면을 단색조의 비구상으로 이끌지 못하고 단조로운 말과 뜻을 새겼다는 태도 때문에 참 엉뚱하다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글씨를 소재로 작품을 하는 이는 브루스 나우만, 조셉 코주스, 제니 홀저, 에두아르도 칵 등 외국의 사례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현역 작가들 중에서도 간간히 목격되기에 독특한 접근이라고도 여겨지지 않는다. 문자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대부분 기록적인 측면이 강하고 특정한 시간과 공간 변화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극단화된 형태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사례를 들고 그 표현의 정당성을 밝히거나 연관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윤미옥은 오래 동안 우리 민화에 관심을 가져왔고 그를 소재로 작품을 한 경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민화의 출발과 끝은 언어다. 그것도 벽사구복의 언어이자 개인적 소망을 대신하는 주문이며 <기원>으로서 세계에 대응하는 것이다. 윤미옥의 이번 작업을 그런 연원의 연장으로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민화의 염원이 그대로 현대적 조형어법으로 전치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렇다고 민화의 재현이나 의미 복사 따위의 느슨한 접근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다. 그가 보는 공간, 그가 만나는 세계는 자신의 몸과 시간을 보아내는 창에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유이기보다 몸의 간절함이라는 점에서 그의 작업은 주목할 부분이 없지 않다.
단색조의 바탕색 위로 하얗게 내리쓰기로 적힌 글씨들은 그 글자 밑으로 몇 겹의 얼룩들을 지각하게 한다. 그 얼룩은 색상이 만든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몇 번이고 그 안으로 글씨의 흔적들이 쌓인 얼룩이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운 반복의 흔적은 하나의 층위를 이루며, 그 층위는 단순한 색상조합이 아니라 말들의 불가능성, 그 불가능성을 다스리며 올라온 것들이다. 그 말들은 온전하게 드러나는, 단숨에 읽어낼 수 있는 문자들이 아니라 몇 겹의 말들로 서로 겹쳐진 말들이다. 해독불가능 하지만 해야 할 것들을 간직한 말들이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글씨 밑으로 몇 겹의 글씨들이 층위를 이루며 해독불가능을 보이고 있다. 그 얼룩진 말들, 해독불가능한 말들 위로 지금의 글이, 말이 드러난 것이다. 시간을 간직한 문자인 것이다. 쓰는 시간과 쓰인 공간이 하나가 된,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는, 시간과 공간의 켜를 그 바탕에 두고 형성된 말이자 형상이다. 그것은 감춰진 욕망이다. 남에게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은밀한 소원이다. 남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드러나는 말이다. 남이 알아듣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신에게 다짐하는 말이며 자신 속에서 드러나는 염원인 것이다. 그 흘려 쓴 글씨들은 남에게 알리는 문자가 아니라 자신의 염원을 간직한, 시간을 담은 깊이다. 날려 쓴 글씨가 읽기 힘들듯 자신의 깊이를 가진 시간은 공유하기 힘들다. 말의 일상은 현재적이고 순간적이다. 그리고 개념적이다. 그러나 그 말로는 담을 수 없어 몇 겹의 말들을 형상화한 것이다. 시간이 내재된 형상, 평범하지만 절실한 <기원>인 셈이다. 넘치는 염원은 말을 빗나가고, 실재를 담을 수없는 말들은 몸으로 울리기를 바라는 날려 쓴 글씨가 된다. 그것은 자기몰입의 형태를 띠고 주술화 된다. 그 울림이 초서의 형상으로 시각화된 것이다.
<기원>은 무엇일까. 언어로 발설하는 것이며 몸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메를로 퐁티의 표현을 빌리면 목구멍을 울리는 몸으로부터 드러나는 근원적인 행위이며, 의미 이전에 이미 형성된 표현인 것이다. 그 언어는 청각으로만 듣는 언어가 아니라 몸을 떨며 나타나는 제스처다. 목소리의 떨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개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합쳐진 말을 담은 공간으로 그의 화면이 생성되는 순간이다. 그것은 대상이 자신이며 자신의 기원이 대상이자 그것을 담은 제스처로서 공간인 것이다. 그의 화면은 말하기의 몸이자 몸의 울림인 것이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행복을 기원합니다.”
“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날려 쓴 글씨로 화면 위에 자리 잡은 이 말들은 문자가 아니다. 그 말들은 이제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몇 겹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형태를 띤 것이다. 문자가 아니라 제스처로 해독불가능한 자신의 염원으로.
민화는 시각과 문자의 만남이 이룬 독특한 공간이다. 그것은 인간의 염원을 담은 문자가 아니라 말의 불확실성이 일상의 표지를 넘어 세계를 보는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윤미옥의 작업은 민화의 주술성이 현대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 해독불가능함은 몸으로 만나질 때 해독가능한 <기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화는 개인적 욕망의 표현이자 우리의 욕망을 대신한다. 그래서 인간의 염원을 보인다, 윤미옥의 작업 역시 개인의 욕망에서 우리의 욕망으로 넘어설 때 주술이 아니라 <기원>이 될 것이다.
– 장소 : 갤러리 화인
– 일시 : 2015. 1. 9 – 1. 15
추PD의 아틀리에 / www.artv.kr / abc@busan.com